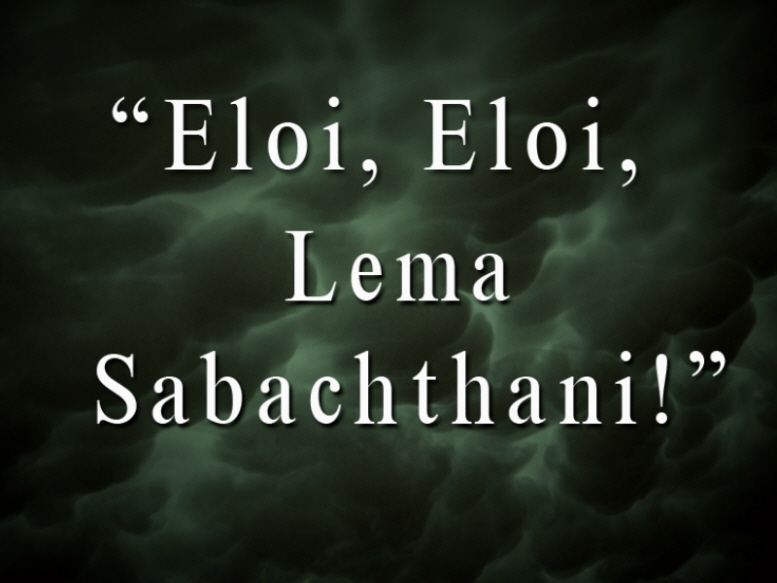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서자 시끌법적한 소리가 제일 먼저 나를 반겼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틀었다. 구레네(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빠른 걸음과 뛰기를 반복한 덕분에 잠시 숨을 돌릴 여유가 있었다. 유월절 저녁 식사 떄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었다.
소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몸을 스치는 사람 수도 늘어났다. 광장은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구레네에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앞으로 헤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뒷꿈치를 올렸다. 앞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몇 차례 껑충껑충 뜀뛰기를 했다. 광장 중앙에는 남루한 차림의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들 앞 단상에는 로마제복을 입은 덩치 큰 사람이 의자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구레네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는 재판 광경이었다.
광장에 모인 사람 수로 봐서 중죄인이 틀림없겠지만 나는 죄인의 재판 따윈 관심없었다.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벌의 경중은 재판관의 몫이었다. 더이상 여기서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바라바, 바라바."
내가 뒤로 돌아서려고 했을 때 나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군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뒤로 돌리려던 몸을 바로 세우며 옆에 서 있는, 턱 수염 긴 노인에게 물었다.
"바라바를 외치는 이유가 뭐죠?"
"청년은 이 고장 사람이 아닌 모양이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손을 들어 검지 손가락으로 광장 중앙을 가리켰다.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본시오 빌라도 총독이요.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라바지."
그리고 노인은 내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야."
나는 그때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총독이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사면하고 싶은 지 군중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군중은 계속해서 바라바를 외치고 있었다. 유월절에 죄인을 사면하는 제도는 나도 알고 있었다. 구레네의 유대인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제도였다.
"예수가 더 악한 모양이지요?"
내 물음에 노인은 주위를 한 번 둘러보며 입을 다시 내 귀로 가져왔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아니야. 예수는 죄가 없어."
말을 마친 노인은 도망치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바라바를 외치는 군중의 소리보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노인의 말이 더 뇌리에 남아 나는 예수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면 나도 메시아다."
바라바를 외치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고 군중은 낄낄거리는 조소로 답했다. 비록 조롱섞인 말이긴 하지만 메시아라는 말에 나는 예수가 더욱 궁금해졌다. 메시아의 기다림은 구레네에서도 예외없었고 나 역시 매일 기도로서 찾던 존재였던 것이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흩어지는 군중들 속에서 예수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누더기 옷에는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했고 그의 창백한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가 얼굴을 들어 앞을 보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빛이었다. 구름이 햇빛을 가려 그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여전히 거친 말을 퍼붓고 있었다. 남은 살리면서 너 자신은 못 살리는구나. 어서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지어보거라, 이 사기꾼아. 성밖으로 나가는 예수를 서둘러 따라나섰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몸에서 빛은 더이상 나오지 않았다.
"예수라는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나는 내 옆에서 걷고 있는, 검은 수염이 얼굴을 덮다시피한 중년 남자에게 물었다.
"골고다 언덕. 처형장이 그곳에 있지."
예수는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가 무거운지 걷고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예수가 쓰러지면 어김없이 날카로운 채찍질 소리가 뒤를 따랐다. 채찍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성벽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모습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다. 노인의 말처럼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죄인이 아님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힘깨나 쓰게 생겼군. 예수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가시오."
행렬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로마 군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것이 한순간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들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법 같은 것이었다. 십자가는 곳곳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다. 피를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 어깨에 걸치자 예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예수는 내 앞에서 걷기 시작했다. 십자가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다행히 예수의 걸음이 느렸으므로 나는 뒤처지지 않고 그를 따를 수 있었다. 몇 걸음 때지 않아서였다. 나는 십자가를 만져보기 시작했다. 나무의 질감은 분명히 느껴졌으나 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깃털 하나를 어깨에 얹고 걷는 느낌이었다. 나는 예수의 거친 호흡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예수는 뒤돌아봄이없이 묵묵히 걷기만 할 뿐이었다.
골고다 언덕까지는 꽤 먼 길이었다. 로마 군인이 가리키는 곳에 십자가를 내려놓았다. 발을 한 걸음 떼다말고 십자가를 발로 툭 건드려보았다. 쇠처럼 묵직한 것이 발끝으로 전해져왔다.
십자가는 하늘을 향해 올려지고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예수의 모습을 나는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며 심호흡을 크게 했다.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스러보였다. 피가 흘러내리는 십자가와 평화스러보이는 예루살렘 사이에서 나는 마치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서둘러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덕을 내려가는 내 귓가로 예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뒤따라 들려왔다. 대낮이었음에도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며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커져갔다. 그러나 나는 뒤를 돌아보지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몇 걸음 뗴지 않아서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는 다른 목소리였다.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 그 목소리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시몬.

 [아리조나 한인문인협회 회원작품] 시월의 그리움 -권준희
[아리조나 한인문인협회 회원작품] 시월의 그리움 -권준희
 [아리조나 한인문인협회 회원작품] 꽃무릇 -아이린 우
[아리조나 한인문인협회 회원작품] 꽃무릇 -아이린 우


















